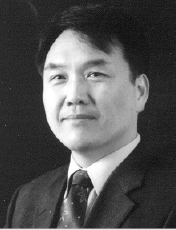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신문지면은 엇비슷하게 닮았다. ‘겉장’과 ‘끝장’ 즉 1, 2, 3, 4, 5, 6, 7면과 28, 29, 30, 31면은 그만그만한 정치, 경제, 사회의 얼룩얼룩한 낯을 싣는다. 그리고는 ‘속장’이라 할 수 있는, 겉장과 마지막장 사이에 낀 22, 23, 24면에 대중문화면이 있다. 사실 신문의 민낯은 여기서 드러난다.
신문의 문화면은 보편적인 가치와 일상적인 가치 사이에 놓는 다리다. 에밀 도비파트(Emil Dovifat)는 “신문은 그의 본성 때문에 문화의 가치를 잔돈푼으로 쪼개기는 하나 그것을 망가뜨리지는 않는다. 신문의 문화면은 다만 이 잔돈푼이 진짜의 돈(통화)이 될 수 있게 조바심을 다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아마도 오늘날 신문들이 겉과 뒤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싣고 그 사이에 문화를 ‘끼워’넣는 까닭은 대중문화를 잔돈푼으로 여기거나 얕잡아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이 사회가 ‘문화’ 혹은 ‘대중문화’를 함부로 보아 버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 사실 ‘대중문화’라는 말 자체가 수상쩍은 말이다. 왜냐하면 ‘대중문화’라고 하면 ‘민중문화’나 ‘민속문화’와 마찬가지로 대중들의 일상 속에서 스스로 떠 저절로 우러나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중매체로 전달되는 문화는 대중의 소비수요를 꼼꼼하게 겨냥하고 헤아려 위로부터 통제되는 산업이며 권력이다. 그러니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말은 완전 뻥이다.
근대 신문이 나타난 유럽 대륙에서는 문화면을 ‘훼이유똥’이라고 불렀다. 이 낱말의 말 뿌리는 나뭇잎사귀 또는 그처럼 얄팍한 종이조각을 말하는 것인데, ‘잎사귀가 곧 뿌리다’라는 의미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발행된 <쥬르날 드 데바>라는 신문은 지면의 1/4을 극장, 서적, 문화기사로 메울 만큼 중요한 지면이 대중문화였다.
신문의 문화면이 그리고 대중문화가 지면과 방송의 앞과 뒤에 끼지 않고 ‘훼이유똥’하는 날을 고대한다.
허태수 (춘천성암교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