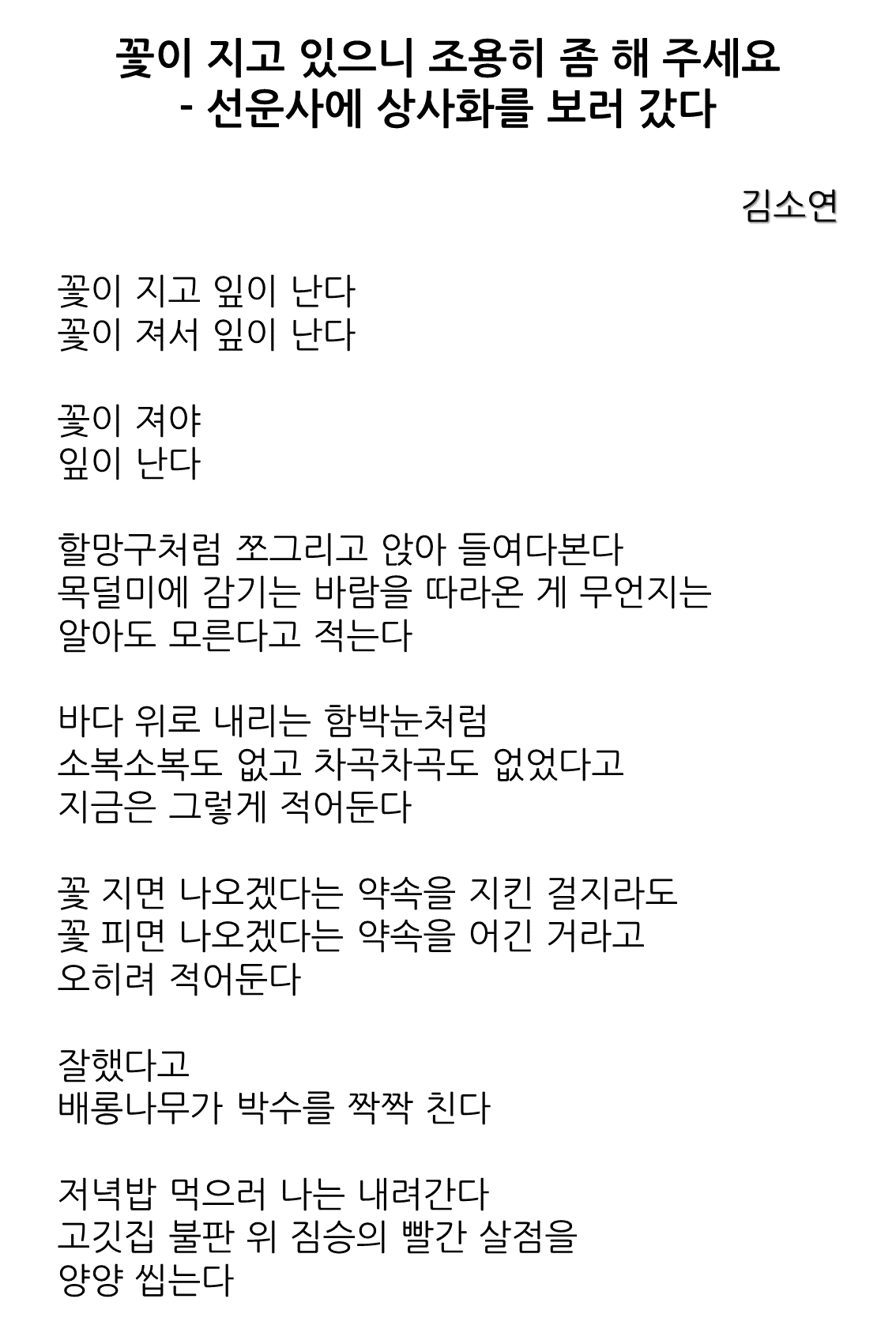
현상은 인과를 전제로 하고 인과는 당위를 전제로 한다. 선운사의 상사화는 이미 지기 시작한 모양이다. 나와 너라는 타자(他者)는 상사화의 꽃과 잎처럼 공존할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아니, 너라는 타자의 희생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할망구의 식견으로 보니 세상의 이치를 알 것도 같다. 하지만 바닷물에 녹아버린 눈처럼 형체도 자취도 열매도 남기지 않는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꽃의 부재가 못내 서운하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낙화의 이유가 오히려 엄숙해진다. 그러나 그것도 어찌 보면 인간인 나의 생각이지 타자인 상사화의 본질과는 어긋날 수도 있겠다, 나는 나의 생존을 위해 타자를 먹는다. 붉은 꽃잎 같은 살점이라도 입에 넣어야 성에 찰 것 같다. 꽃대를 밀어내기 위해 시들어버린 잎처럼 죽은 타자가 나의 몸을 이룬다. 나인가 너인가 우리인가.
수많은 타자의 핏물로 이루어진 우리는 ‘우리’를 배반한다. 잎과 꽃이 피는 거리는 감당할 만 한가?

송병숙(시인)
chunsara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