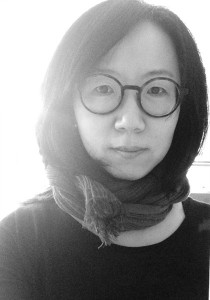화가는 여러 사람을 만난다. 초등학교 동창생부터 여자후배, 남자친구, 여자친구, 교회 목사님까지. 화가는 그들과 긴 얘기를 나눈다. 세 시간은 거뜬히 채울 이야기꾼이다. 자신의 그림을 배경으로 앉아 있는 그들, 그 순간을 깊이 간직하는지도 모른다. 화가의 그런 습성은 그림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림 속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홀로 걷는 사람, 다정한 커플, 심지어 가로등 밑 고양이까지. 그녀 작품 속 인물들도 관객에게 무언의 말을 건네 온다.

어쩌다 작품에 대해 물어보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는다. 자취방으로 돌아가던 골목길의 밤하늘이라거나, 친구의 여행사진 속 풍경에서 받은 느낌이라거나, 외국 여행에서 만난 작은 분수의 인상이라거나. 작가는 자연이나 일상 공간의 찰나적인 순간에서 뇌리에 박히는 느낌을 포착해낸다.
이야기에 심취한 그녀 얼굴을 물끄러미 본다. 이목구비가 분명하다. 좋은 붓으로 단숨에 그려낸 것처럼 균일하면서도 섬세한 선이 단호한 인상이다. 무엇보다 유난히 투명한 눈이다. 빛에 반응하는 홍채의 검은 선은 말로 도달할 수 없는 세계에 감각적으로 접촉하는 무의식의 틈새를 선명하게 내비춘다. 서늘하다. 유쾌한 그녀의 이야기가 잠시 멈춤 상태로 전환되면 표정은 채색되지 않은 종이처럼 말끔히 처음으로 돌아간다.
화가는 작은 작품들에 담긴 사연들을 말한다. 몇 년 전 큰 부상으로 척추치료를 받으며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을 보냈다. 그 무렵 사랑도 잃으면서 정서적인 죽음 상태를 경험했다고.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치료 효과는 더뎠다. 몸보다 마음의 병이 더 지배적인 시간이었다.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도와주고, 친구들이 찾아오면서 사랑받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면서 조금씩 회복해 다시 작은 그림부터 그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화가의 작은 그림에 반응한다. 이름을 묻고 나이를 묻는다. 서른한 살의 젊은 화가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린 지 채 4~5년에 불과하지만 그림 속의 정서는 묘하게 세대를 넘는다. 화가는 자신의 그림에 표현된 스토리와 색채를 ‘멜랑콜리(melancholy)’라 말한다. 슬픔과 행복의 양극단이 충돌하는 중간지대로서 멜랑콜리는 긍정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힘을 품고 있다고. 이별과 사고를 겪으면서 멜랑콜리는 변하고 있다. 이전 그림이 ‘슬프지 않은데 슬픈’ 정서를 담았다면, 이제는 ‘슬프지만 슬프지만은 않은’ 정서를 표현하려 노력한다고.
외동딸로 귀하게 자랐을 것 같은 화가에게 슬픔의 정서는 낯설지만 그녀는 일곱 살까지 아버지가 없었다. 유학 떠난 아버지의 빈자리를 엄마와 외할머니가 힘겨운 돈벌이로 채워왔다. 작가는 조심스레 첫 기억을 더듬는다. 아이 혼자 라디오를 듣는다. 슬픈 음악이 흘러나와 라디오를 끄고 엄마가 들려주었던 ‘백조의 호수’를 듣기로 한다. 그림을 보고 레코드판을 찾아 걸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되뇐다. 아이는 이미 예술가의 슬픔과 기억을 안고 자라서 지금 슬픔의 힘을 그림으로 만나는지도 모른다. 그 옛날 듣지 못했던 소리까지 담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