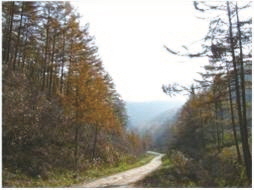
일제강점기 초까지 육로로 서울에서 춘천으로 들어올 때 넘어야 하는 큰 고개가 있었는데, 바로(席破嶺)이다.은 지금 교통로(交通路)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고 관광상품화 되어 ‘봄내길’로 조성되었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북한강 줄기를 따라 삼악산 앞으로 처음 도로가 개설된 것은 1922년이다. 이 도로가 경춘선으로 2022년이면 개통 100주년이 된다. 이 경춘선이 뚫리기 전까지 춘천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고개가인 셈이다. 춘천에서을 넘으려면 신연강나루에서 배를 타고 덕두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덕두원에서을 넘으면 당림리가 나온다.
춘천은 조선시대 서울에서 가까운 유배지로 인식될 만큼 험준한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춘천으로 오는 고을 원님은 좌천이나 된 것처럼 인식했고, 춘천을 떠나게 된 고을 원님은 유배지에서 풀린 듯이 좋아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춘천을 떠나는 원님과 춘천으로 들어오는 원님이 마주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이었다고 한다.
석파령을 한자로 쓰면 자리 석席, 깨뜨릴 파破, 고개 령嶺인데, 파견되는 원님과 이임하는 원님이 이곳에 자리를 깔고 신구(新舊) 원님 교대식을 하며 술잔을 나누고 자리를 파한 고개라는 뜻에서 붙여졌다고도 한다.
석파령은 험하기 이를 데가 없었으니, 상촌 신흠(申欽, 1566~ 1628)은 “석파령에 이르렀을 때 그 험준함에 겁을 먹은 나머지 말을 놓아두고 걸어갔는데 바로 아래 낭떠러지를 보고 무척이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석파령은 1895년 을미의병 당시 습재 이소응을 의병대장으로 하는 춘천의병이 서울의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넘었던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다.
또한 수많은 민초들이 자기만의 한을 지닌 채 넘던 고개이기도 하다. 춘천으로 유배나 발령을 받아 오던 양반들도 넘어야 하는 고개이며, 당림리에서 덕두원으로 시집을 오고 장가를 갔던 사람들의 사연이 서려 있기도 하다.이야말로 오르막을 오르고 나면 내리막의 참 묘미를 경험하게 되는 인생살이와 일치한다.
우사(雩沙) 이세백(李世白, 1635~1703)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읊었다.
驛程東去轉崎嶇 동으로 길 떠나니 길은 구불구불해지고
席嶺高高峙一隅 높고 높아 한 모퉁이에 솟았네.
濬壑千尋看自悸 골짜기 천 길이라 내려다보면 가슴이 떨려
懸崖百折步仍扶 백 굽이 벼랑에 걸음마다 부축을 받네.
鳥跡纔通信畏途 새도 겨우 지나가니 참으로 두려운 길이라.
行路世間何獨此 세상살이 어찌 혼자만 이렇겠나.
側身西望秖長吁 몸 기울여 서쪽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쉰다.
이세백은 조선 숙종대 좌의정을 지낸 분으로 춘천을 넘으며 이 시를 남겨놓았다.이 하늘 한 모퉁이에 솟을 정도로 높게 솟아 있고, 고갯길은 천 길이라 내려다보면 가슴이 떨릴 지경이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부축을 받아야 될 정도인데 백 구비나 된다. 중국의 험준하기로 악명 높은 촉(蜀)도 이곳에 비하면 평지와 같을 것이라 하며 새도 겨우 지나갈 정도로 넘기 어렵다고 했다. “세상살이가 이 고개를 넘는 것과 같을 것인데 어찌 자신만 이렇게 힘들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세상살이의 고달픔을에 비유했다.
인생길에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이 말은 오르막의 어려움을 이겨내면 편안한 내리막이 있다는 뜻으로도 읽히지만, 높이 오를수록 내려와야 하는 높이가 커진다는 이치 또한 잊지 말아야함을 담보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생사 새옹지마(塞翁之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