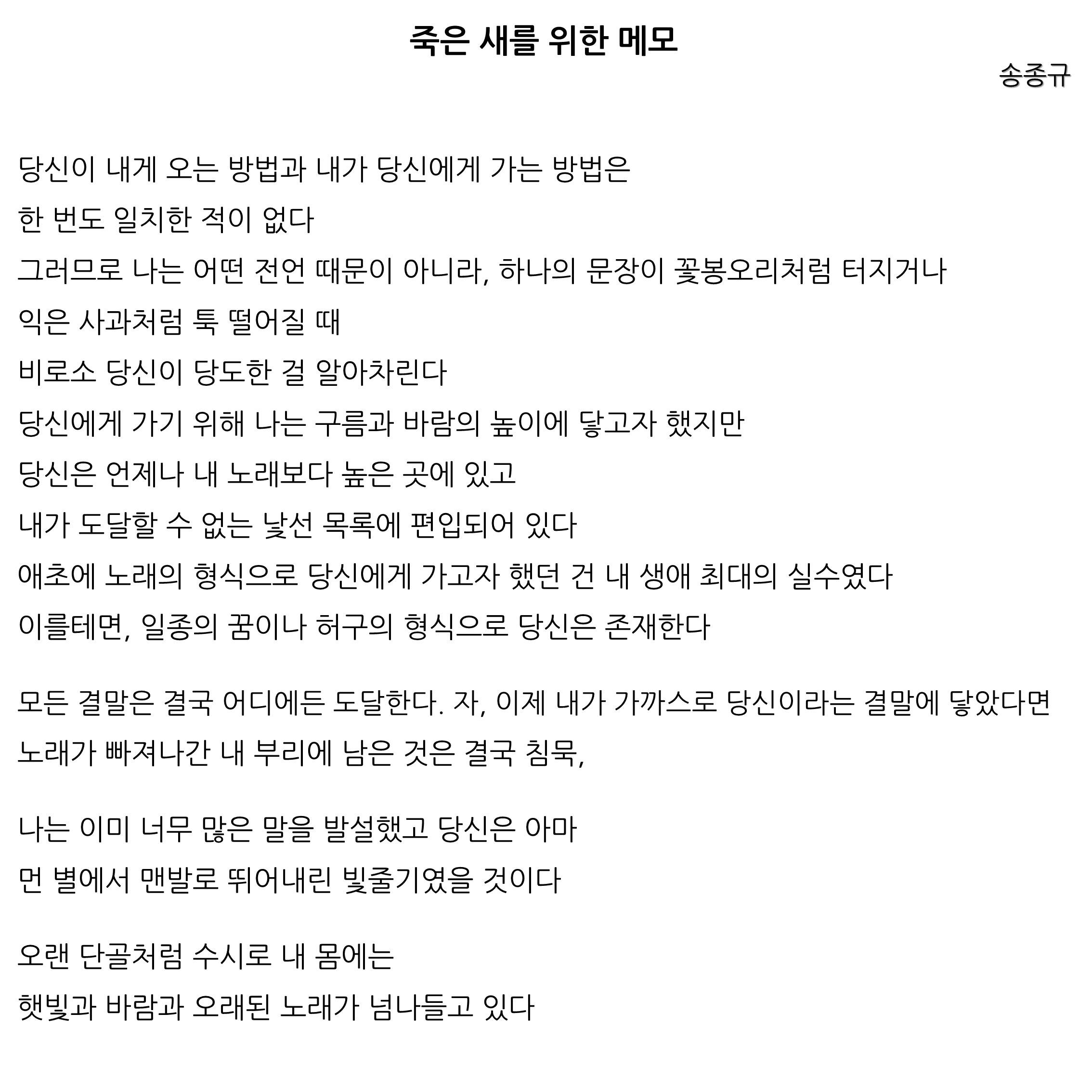
당신이 내게 오는 방법과 내가 당신에게 가는 방법은 한 번도 일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향한 노래를 멈출 수가 없다.
나는 그에게 닿기 위해 숱한 잠을 물리쳤고, 오솔길에 등불을 달았으며, 작은 날개를 쉬지 않고 퍼덕거렸다. 하지만 늘 길목을 비켜간 그대, 끝내 잡을 수 없는 당신은 꿈이거나 허구다. 비록 언젠가 그대에게 도달한다 해도 당신은 이미 내가 닿고자 하던 당신이 아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내게 별빛으로 당도했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존재를 알아볼 수 없는 정오의 하늘이었거나 지쳐 잠든 자정이었거나 초저녁 미리 닫아버린 창문 너머 수런거리는 호숫가이었는지도….
삶은 부조리하다. 모두 타버린 뒤에 남은 정결한 뼛가루. 욕망과 죽음의 혼용을 거쳐 어렵게 도착한 하나의 문장으로 당신은 내게 온다. 합일점이 없는 긴 장대 끝에서 시지프스가 쿵쿵 발을 구른다.
잠깐 동안의 멈춤, 저 흔들림. 결코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을 향해 무겁지만 단호한 걸음을 내딛는 한 사내. 뻣뻣하게 식은 새의 주검 위에 늦게 도착한 햇살과 바람과 제 몸을 얼려 눈꽃을 하얗게 피워 올린 소나무의 시린 노래들이 겨울 한나절을 싸하게 흔들고 있다.

송병숙 (시인)
chunsara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