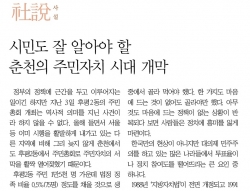
정부의 정책에 근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지난 3일 후평2동의 주민총회 개최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들면서 서울 등 이미 시행을 활발하게 내가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그리 늦지 않게 춘천에서도 후평2동에서 주민총회로 주민자치의 서막을 활짝 열어젖혔기 때문이다.
후평2동 주민 1만5천 명 가운데 법정 정족 비율 0.5%(75명) 정도를 채울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1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숫자도 숫자지만 분과위원회를 통해 제안을 숙의하는 과정에서도 진지한 자세를 보여 열기 역시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한다.
자치단체장과 지역의원을 내 손으로 뽑는 자치 분권이 시행되고 있는데 주민총회 한번 한 것 가지고 ‘역사적 의미’ 운운할 이유가 있나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간 지방자치의 역사를 잠깐만이라도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틀렸음을 금방 깨달을 수 있다.
지방자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다.
단체자치란 지방정부와 의회를 통해 주민 혹은 시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개념이다. 선거로 뽑은 대표들을 통해 다양한 결정과 집행을 하기 때문에 대의적 성격이 강하다. 이에 반해 주민자치는 직접민주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사업의 제안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직접 관여한다.
이번에 후평2동에서 주민자치회가 행한 일체의 과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거 단체자치만 통용되던 시절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던 일이다. 풀뿌리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실제와는 달라 주민들은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던져주는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골라 먹어야 했다. 한 가지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도 골라야만 했다. 아무 것도 마음에 드는 정책이 없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정치에 흥미를 잃게 마련이다.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지만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투표율이나 정치 참여도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 중 하나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시행됨에 따라 부활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주민자치는 그간 크게 두 단계의 변화를 거친다. 첫 번째는 1999년 주민자치센터(현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출범이다. 같은 해 2월 행정자치부의 “읍, 면, 동 기능전환 시범실시 지침” 시달에 의해 시행된 내용이지만 센터와 위원회는 자치보다는 복리 증진에 방점을 찍었다.
여기까지는 단체자치만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2013년이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공포와 함께 도입된 주민자치회가 전국 지자체 읍·면·동에서 한두 개씩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렇듯 더디지만 끊임없이 생명력을 이어 온 주민자치의 흐름이 이제 대한민국 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를 열려고 한다. 후평2동에 이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나머지 7개동에서도 곧이어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흐뭇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완전한 주민자치의 시대가 되는 그날까지 춘천시민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공무원이나 시장, 의원이 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면 더더욱 참여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