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30여 년 전, 우리 가족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버섯재배를 많이 하는 동네였는데 비닐하우스 바깥에 보온덮개를 씌우고 살림살이를 들여 나름대로 가정집의 구색을 갖추기는 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는 비닐로 덮어씌우다 보니 통풍이 잘 안 된다는 점이었다. 이사한 첫날부터 난리가 있었다. 겨울이라 연탄보일러에 불을 피우고 잠이 들었는데 연탄가스로 인해 자칫하면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 했던 것이다. 또 통풍이 잘되지 않으니 실내에 습기가 차는 것도 문제였다. 여름이면 벽이며 천장에 검은 곰팡이가 시커멓게 뒤덮여 마른 걸레로 아무리 닦아내도 그때뿐이었다. 피부 건강에도 치명적이었다. 피부가 약했던 나는 여름이면 부드러운 피부가 짓물러서 4학년 때는 학교를 한 학기 동안 쉬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좋지 않았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져 갔고 지금 그 시절 기억을 더듬으면 웃지 못할 하나의 에피소드만이 또렷하다. 물론 이 또한 통풍이 안 되는 비닐하우스와 연관이 있다.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었던 것 같다. 연탄보일러가 있었지만 화력 면에서나 비용 면에서나 난로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 거실에는 무쇠로 만든 커다란 연탄난로가 있었다. 난로 위에 고구마를 올려놓고 구워 먹기도 하고, 펄펄 끓는 목욕물을 데우기도 했던 다용도의 난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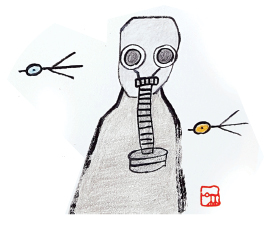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겨울방학의 무료함에 지친 나는 어머니가 연탄을 갈아 끼우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연탄재를 쌓아두는 통 안에서 아직 벌겋게 이글거리는 연탄재를 바라보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마침 오줌이 심하게 마려웠던 터라 ‘내 오줌으로 저 연탄불을 끌 수 있을까?’하는 궁금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창 호기심이 왕성했던 나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지춤을 풀고 시원하게 연탄을 향해 오줌을 발사했다.
“치이이이이익!”
생각보다 굉장한 볼거리였다. 연탄불은 얼마든지 덤비라는 듯 쏟아지는 물줄기(?)를 보기 좋게 받아내며 화기를 조금도 수그릴 줄 몰랐다.
문제는 잠시 후였다. 근처에 계시던 아버지가 고함을 치시며 거실로 뛰어들었다. 자욱한 수증기를 연기로 오인하시고 불이 난 줄로 착각하신 모양이었다. 목에 걸치고 있던 수건을 휘두르며 불을 끄려고 달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내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알아채고 고함을 치셨다.
나는 뭐가 우스웠는지 마치 동네 주민들을 속인 양치기 소년마냥 깔깔 웃으며 자지러졌다. 어느새 어머니도 달려와 눈이 휘둥그레져서 영문을 파악하고 있었다. 잠시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 집 거실은 오줌이 만든 수증기로 가득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문과 창문을 모두 열고 환기를 시키기 시작했지만 아까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 집은 통풍이 안 되는 집이었다.
좀처럼 큰소리를 안 내시는 부모님께 한바탕 꾸중을 듣고 부모님도 나도 어느 정도 진정은 됐지만 그놈의 ‘찌릉내’는 집안 구석구석 스며들어 빠질 줄을 몰랐다. 게다가 여느 ‘찌릉내’와도 달랐다. 그것은 보통 ‘찌릉내’가 아니라 기화된 ‘찌릉내’였기 때문이다. 2살 아래의 여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코를 쥐고 울상이었다. 딴은 대단한 ‘찌릉내’였나 보다. 30년도 더 지난 내 머릿속에서도 아직 냄새를 피우고 있으니 말이다.
만약 그 향기가 궁금한 독자가 있다면 충고한다. 아무리 궁금해도 따라하지는 마시기를.
정리: 홍석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