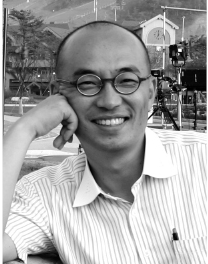유강희
구름 곁에서 자보고 싶은 날들도 있지만
내일은 그냥 걷다 옆을 주는 꽃에게 바람이 마음 준 적 있는지 묻겠다
곁이 겨드랑이 어느 쪽인지, 옆구리 어떤 쪽인지
자꾸 사람에게 가 온기를 찾아보는 쓸쓸이 있어
나는 간혹 몸 한켠을 더듬어 볼 텐데
야윈 몸에 곁이 돋으면 너에게 가겠다고 편지하겠다
곁이라는 게 나물처럼 자라는 것인지
그리하여 내가 내 곁을 쓸어 보는 날엔
나무가 잎사귀로 돋는 곁이 있고 별이 빛으로 오는 곁도 있다고 믿어보겠다
가령 어느 언덕배기 세상에 단 둘이 곁으로 사는 집, 비추는 달빛도 있다고 생각하겠다
고작해야 이 삶이 누군가의 곁을 배회하다 가는 것일지라도
곁을 준다 줄 것이 없어서 곁을 주고 세상의 모든 곁이 다 그렇다
언제까지 곁에 두고 싶은 시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민왕기 시인의 시, ‘곁’이 그런 시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 곁으로 띄워보내니 이번 한 주 곁에 두고 따뜻하게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이라는 존재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에게 가 온기를 찾아보는 쓸쓸이 있어’ 자기 몸의 한켠을 더듬어 보면서 ‘야윈 몸에 곁이 돋으면’ 쓸쓸한 당신에게 찾아가겠다, 편지를 보내오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작해야 이 삶이 누군가의 곁을 배회하다 가는 것일지라도/ 곁을 준다’며 당신에게 한줌 봄볕 같은 봄나물 같은 곁을 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인은 ‘줄 것이 없어서 곁을’ 준다고 말하지만, 곁을 준다는 건 마음을 준다는 것이니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지요. 곁을 내준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지요. 도심의 지하철 풍경을 한 번 보세요. 혹시라도 누군가 곁을 비집고 들어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표정들. 곁을 내주기 싫어 몸을 비틀고, 마침내 그 “곁” 때문에 시비가 붙는 출근길 모습. 그것이 어쩌면 일그러진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는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곁을 내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곁이 되어주는 것. 그런 게 사람살이고 모듬살이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곁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지금이라도 내 곁에 “곁”을 잃어버린 누군가 쓸쓸히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내가 내어준 작은 곁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불이 될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박제영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