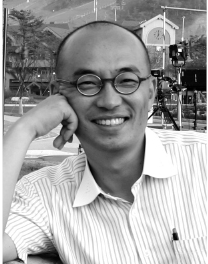유금옥
이 고장에서는 봄도 치우지 않습니다
지난 가을 요양 온 나는
그리움을 치우지 않고 그냥 삽니다
대관령 산비탈 작은 오두막
여기서 내려다보면, 눈 내린 마을이
하얀 도화지 한 장 같습니다
낡은 함석집들의 테두리와 우체국 마당의 자전거가
스케치 연필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직 채색되지 않은 3월, 겨울이 긴 이 고장에서는
폭설이 자주 내리지만 치우지 않고 그냥 삽니다
여름도 가을도 치운 적이 없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도시처럼 눈을 포클레인으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다만, 담뱃가게와 우체국 가는 길을
몇 삽 밀쳐놓았을 뿐입니다 나도 山만한 그대를
몇 삽 밀쳐놓았을 뿐입니다
면사무소 뒷마당,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포클레인 한 대가 보입니다
지지난해 들여놓은 녹슨 추억도 이 고장에서는
치우지 않고 그냥 삽니다
- 《현대시》 2009년 4월호
대관령의 어느 산비탈 작은 오두막이 아마도 시인의 임시 거처인 모양입니다. 도시 생활에서 얻은 병을 치유하기 위해 요양 차 머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무슨 병일까요? 몇 번을 읽고 보니 시인의 병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어떻게 옷을 갈아입든 모르고 사는 사람들. 사실 도시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읽어내기가 쉽질 않지요. 왜냐면 금세 치우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지난 것, 지난 계절을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그렇게 늘 깨끗이 새 것으로 정돈됩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병이었던 겁니다. 도시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어쩌면 지난 것을 깨끗이 지우는데 익숙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회용처럼 쓰고 버리고 치우는 것. 사람도, 사랑도, 그리움도… 그러나 어디 그런가요? 때로는 山만한 그리움도 있는 법이니. 山만한 당신도 있는 법이니. 山만한 것을 치우기가 어디 그리 쉽겠습니까? 그러다 탈이 나고 병이 난 것이지요.
시인은 이제야 ‘그냥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일 겝니다. “山만한 그대”를 치우는 대신 “몇 삽 밀쳐놓는” 섭리를 배우고 있는 중일 겝니다. ‘눈도, 봄도, 여름도, 가을도, 오래된 녹슨 추억조차도 치우지 않고 그냥 사는 법’을 말입니다.
“그냥 삽니다”
그러고 보니 여백과 여운이 참 깊고 긴 말입니다.
박제영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