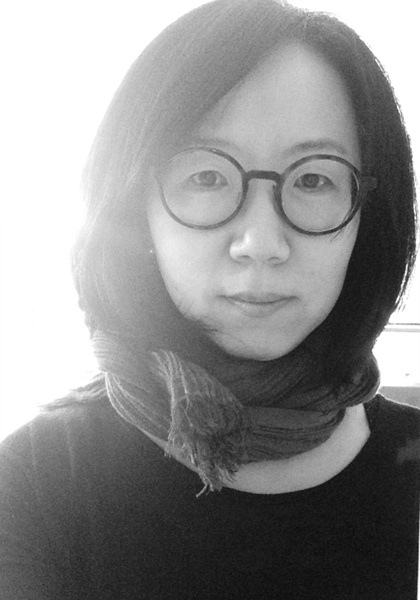얼마 전 경비실에 택배를 찾으러 갔다가 경비원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었다. 지난달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 대표를 살해한 소식을 들은 데다, 우리 아파트의 현실은 어떤지 궁금하고 염려됐기 때문이다. 경비원의 노동과 임금, 고충에 대해 듣고 두 가지 문제를 돌아봤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은 격일제로 근무하며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6시에 퇴근한다. 꼬박 24시간을 근무 공간에서 보낸다. 하루 휴게시간으로 점심 2시간과 저녁 1시간 30분, 취침 4시간까지 총 7시 30분이 주어진다. 근로기준법에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비원에게 8시간 휴게시간을 두지만 실제로 우리 아파트를 비롯해 대다수의 경비원들은 그 휴게시간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듯하다. 그럼에도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임금도 받지 못한다. 이렇듯 경비원에게 보장된 휴게시간을 무시하고 입주민 편의대로 택배 수령시간을 요구했던 경기도 어느 입주민 대표의 주장은 서로 맺은 근로계약을 간과했거나, 알면서도 강요하는 ‘갑’의 횡포가 아닐까.
아저씨는 올해 63세로 경비원으로 일한 지 5년째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육체적으로 특별히 힘든 건 없다.
하지만 사람들의 차별적인 시선이나 폭언으로 받는 정신적 상처가 더 크다. 사복을 입을 때와는 달리 경비원 옷을 입으면 무시당하는 걸 느낀다. 일례로 외부인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으면 상대는 먼저 위 아래로 훑어보고는 막말을 한다. 지난 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분신을 한 사건도 돌이켜 보면 그가 입주민에게 받았던 모멸감이 원인이었다. 어느덧 한국 사회에서 경비원이 대표적인 ‘을’의 모습으로 언론에 거론되는 현상은 어떤 이유일까.
요즘 아저씨는 내년이면 64세 정년이라 그 이후가 고민이다. 이마저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이 자리를 원하는 대기자가 많다는 말이기도 하다. 불황과 실업의 터널은 끝도 보이지 않는데 자본과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사람들의 관계는 단절되고 종속됐다.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까지 침범한 자본의 논리는 인간에 대한 존엄마저 잃게 했고,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아파트 문화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배려마저 빼앗아갔다. 잃어버린 존엄과 관계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박미숙 (글쓰기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