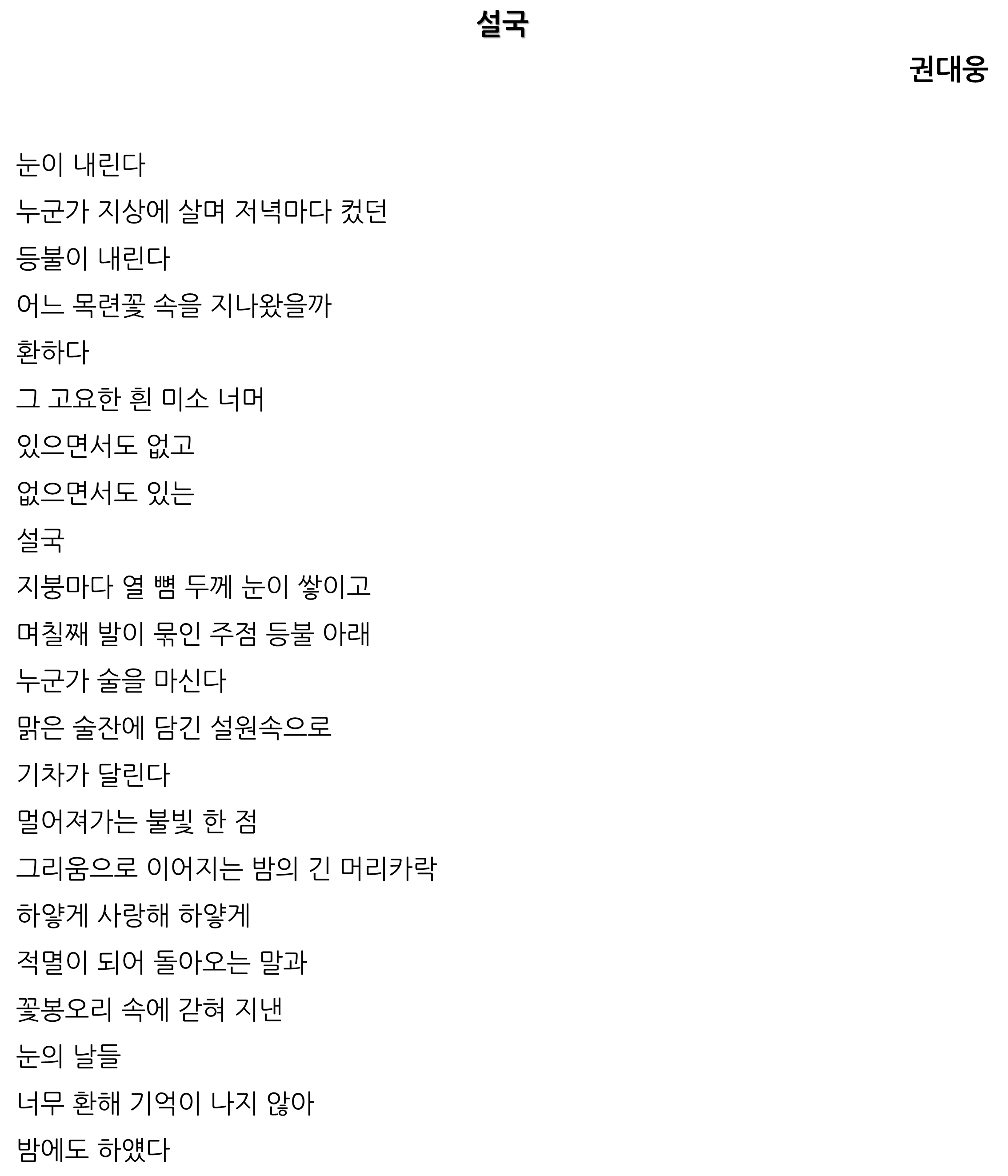
밤눈은 등불을 찾아 내린다. 가로등 밑으로도 내리고 불빛 새나오는 창가에도 내린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거다. 모든 존재는 빛을 통해서 드러난다. 시인은 밤눈을 “누군가 지상에 살며 저녁마다 켰던 등불”이 내리는 거라고 말한다. 그것도 “어느 목련꽃 속을 지나온” 등불이란다. 눈 내리는 저녁 등불을 켰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눈 내리는 밤 “며칠째 발이 묶인 주점”에서 설원을 달리는 기적소리를 들으며 술을 마신 밤이 내게도 있었던가? 없다. 그러나 있었다. 시인의 말처럼 눈의 날들이 너무 환해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다. 눈 내리는 밤 하얗게 기억을 지우며 술잔 속으로 기차가 지나가는 주점을 수소문 해야겠다
정현우 (시인)
정현우 (시인)
chunsara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