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져서, 나 자신과 나의 글쓰기, 그렇게 단둘이었다.”
마르그리트 뒤라스는 ‘글(écrire)’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무엇을 쓰는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작가 본인인 ‘나’와 ‘글쓰기’외엔 없는 고독 속으로 스스로를 가둔 작가의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춘천에는 은둔자의 집, 이은당(怡隱堂)이 있다. 추사의 집과 꼭 닮은 그 집에서 화가 서숙희는 대부분의 하루를 그림 그리는 데 할애한다. 작품활동을 한다고 보기보다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 아니 유일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작은 오죽 숲길을 따라 집과 작업실을 매일 오가는 작가는 항상 바라보는 대나무와 집, 그릇, 나무를 그린다. 반경 50m를 넘어서지 않는 풍경들이다. 이들은 화면 속에서 개별적인 가시성을 띄지 않고, 실루엣, 빛, 색 등 어디에서나 있을 단순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작가는 아크릴판으로 상자 형태의 캔버스를 제작함으로써 평면에 3차원의 공간감을 의도하였다. 아크릴판은 그 자체의 투명성을 품고 있으므로, 주위의 빛과 음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계를 주고받는다. 빛의 위치와 강도에 따라 드리워지는 색 그림자와 공간감은 그대로 그의 작품의 일부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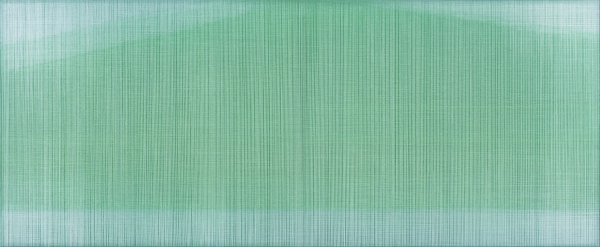
작가에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대상을 기억하는 방식이다. 정확히 말하면 긁고 지우는 행위의 반복을 통해 대상을 기억한다. 이는 앞에 놓인 사물을 보고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기억을 더듬는 행위이다. 기억에 새겨놓은 사물의 기록은 화면 위로 수 없는 긁기와 사라짐의 반복적인 직조를 통해 상기된다. 마치 세모시천을 닮은 격자의 홈들 사이에 물감이 스며든다. 정작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형태는 끊임없는 사라짐과 나타남 속에서 자리 잡아간다, 투명한 아크릴판의 공간감 위로 음영처럼 드리워지는 사물의 형체는 무수히 새겨지는 선들의 시간 속에 아스라이 드러난다.
이처럼 새기고 지우는 반복을 통해 사물의 기억을 흔적으로 기록하는 서숙희의 작업은 ‘그리는 자’로서의 간결한 자세 외의 모든 것들을 걷어낸, 화가 본연의 태생적인 삶의 방식과 다르지 않다. 그리는 행위만이 남은 담백한 화면이 주는 울림은 그 어떤 강렬한 대상을 그린 작품에서 보다,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생채기를 낸다.
정현경(큐레이터)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