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욱진 《강가의 아뜰리에》와 장경수 《내 아버지 장욱진》

일제강점기와 한국동란, 피난 생활 등 고단하고 힘든 시기에 화가로 일생을 보낸 아버지. 섬세하고 예민한 아버지에게는 너무 혹독한 세월의 연속이었다. 그 어려운 세월을 “나는 그림 그린 죄밖에 없다”라고 하시며 평생 붓 하나 들고 철저하게 외통수로 흔들림 없이 화가의 길을 가신 분이 우리 아버지다.
《내 아버지 장욱진》에서 딸 장경수는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에 대한 완벽한 이해이자, 최고의 찬사다. 그림 그린 죄, 너무 아름다운 죄를 가진 장욱진은 오늘 우리에게 처절하고 철저하게, 그래서 오히려 단순한 미학으로도 참된 인생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술을 마신다는 것만도 미안한데 어찌 안주를 말할 수 있겠느냐?”라며 소금으로 만족했던 생활 철학처럼 그림과 글 곳곳에서 절제하면서도 완고한 사람 장욱진을 만날 수 있었다.
장욱진은 《강가의 아뜰리에》에서 “나는 화가가 아니라 환쟁이”라고 했다. 그는 그림 그림을 사랑했다. 나무와 까치와 해와 달과 가족 등 일상적이고 친근한 소재들을 유화·먹그림·매직펜그림·판화·표지화·삽화·도자기그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했다. 그는 “심플한 그림을 찾아 나섰던 구도의 긴 여로 끝에…오로지 아름다움에다 착함을 더한 데에 진실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찾아 평생 쉼 없이 정진했다.” “그림처럼 정확한 나의 분신은 없다”라며 “참된 것을 위해 뼈를 깎는 듯한 소모”를 마다하지 않고 “그림으로 자기 고백”에 전념하고 또 전념했다.
화가 장욱진은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했다. 그의 많은 작품에는 어린 딸들이, 죽은 막내가, 불공을 드리는 아내가 자주 등장한다. “나는 누구보다도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 그 사랑이 다만 그림을 통해서 서로 이해된다는 사실이 다를 뿐”이라며 가족에 대한 사랑을 직접 표현했다. 그 사랑의 절정은, 일주일 동안 불도 때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은 채, 불공을 드리는 부인을 관찰하여 그려낸 ‘진진묘眞眞妙’에 훌륭하게 드러난다. 조리기구도 마땅치 않았던 그 시절에 손수 카레를 만들어 먹이고, 지나치게 전위적으로 딸의 머리를 깎아주던 ‘가장 부드러운 자유인’의 모습을 《내 아버지 장욱진》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심플하다. 때문에 겸손보다는 교만이 좋고, 격식보다는 소탈이 좋다…평생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림만 그리며 살아왔으니 나야말로 행복한 자임에 틀림없다.”
화가는 단순하고 무상(無相)하며 깨끗하게 살았다. 교수가 되어서도 ‘심플’과 ‘깨끗이 살려는 고집’은 변함이 없었다. ‘자기의 예술은 자기만이 하며 그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가장 밀도 있는 단순함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화가가 머물렀던 방에는 남아 있는 게 없었다고 한다. 깔끔한 성격에 물건을 모아두지 않아서 정리할 유품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작은 화폭 속에 화가는 한가롭게 누워 있다. 그림으로 진지하게 고백한다는 화가는 나무 한 그루와 까치 한 마리로 말을 건넨다. 허영과 욕심으로 얼룩진 너희들은 웃고 있는 것이냐, 울고 있는 것이냐. 진실한 그림을 만나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던지던 화가의 질문을 이 글을 읽는 모두에게 던져 본다.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장욱진은 한국 근현대 화단을 대표하는 서양화가다. 지난해 9월 14일부터 그의 예술 세계를 집대성한 ‘가장 진지한 고백: 장욱진 회고전’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회는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2일까지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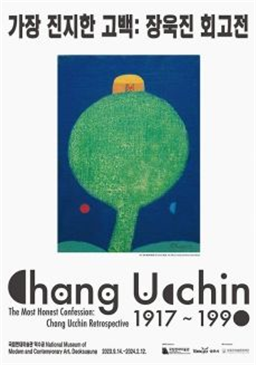
김정민 시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