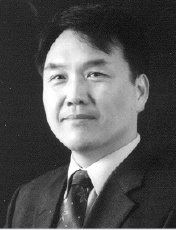춘천에 살면서 봉의산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봉의산에서 떨어져 나와 물 가운데 홀로 떠 있는 ‘봉리산(鳳離山)’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리고 그 작은 봉의산을 ‘고산(孤山)’이라고 부른다는 것과, 이름 두 개로도 모자라 누군가 부래산(浮來山)이라 했다는 이 작디작은 산에 마음을 뺏겨 시문을 지은 매월당 김시습과 백사 이항복을 떠 올리려는 혼은 얼마나 될까?
백사 이항복이 소양강을 지날 때 지었다는 시 한 수를 들어보자.
만계소양하(晩計昭陽下) 느즈막이 소양강 아래에서
동군노일간(同君老一竿) 그대와 함께 낚시를 하며 늙었네.
물우생사박(勿憂生事薄) 살아가는 일이 부박함을 근심하지마라
자유부래산(自有浮來山) 저절로 온 부래산도 있는 것을.
매월당 김시습의 노래는 차라리 도가의 운율이 흐른다.
孤山煙浪泛扁舟(고산연랑범편주) 고산 안개 낀 물결에 조각배를 띄우니
壁層崖蕩客愁(초벽층애탕객수) 깎아지른 높이만큼 시름이 몰려오네.
漁笛帶風聲(어적대풍성뇨) 고깃배의 피리소리 바람에 실려 오고
江波涵日影悠悠(강파함일영유유) 강에 담긴 해 그림자 길어지는구나.
錦鱗因餌牽絲出(금린인이견사출) 미끼를 문 물고기 낚싯줄에 달려 나오며
彩鴨隨派得意浮(채압수파득의부) 물결 따라 채색 오리 마음껏 떠다닌다.
從此盡抛名利事(종차진포명리사) 이곳에서 세상 명리(名利) 던져버리니
一竿明月占派頭(일간명월점파두) 밝은 달빛 한 줄기 강물에 퍼져가는구나.
봉의산과 고산을 가운데 두고 펼쳐지는 팔경은 어디로 갔는가!
※ 팔경은 구름이 머무는 봉의산을 표현한 봉의귀운(鳳儀歸雲), 험한 바위에 부는 솔바람의 호암송풍(虎岩松風), 꽃이 핀 산의 맑은 모습의 화악청람(華岳淸嵐), 월곡리의 아침 안개 월곡조무(月谷朝霧), 우두동 들판의 저녁연기 우야모연(牛野暮煙), 매화꽃 핀 강에서 들려오는 어부의 피리소리 매강어적(梅江漁笛), 모래톱의 돛단배 노주귀범(鷺洲歸帆), 고산의 저녁노을 고산낙조(孤山落照)를 말한다.
고산녹조엔 물화에 눈뜬 오리 떼(貪官汚吏)가 둥둥 떠다니고, 방달불기의 시대정신과 풍류는 그들의 밥이 되었다. 이 도시에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가? 본시 ‘사람’이란 건덩대고 돌아다니는 두 발 달린 고등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꿰뚫고 사는 존재-史覽’를 말한다.
그래서 사람이 없다는 거다.
허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