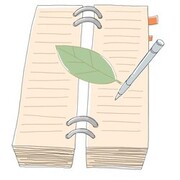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는 나의 인생
오늘을 사는 나를 쓰건, 지금껏 살아온 내 인생을 정리하건 글을 쓴다는 것은 버겁다. 밥 먹고 살기 위해 거의 매일 새벽부터 앉아서 글과 씨름하는 나도 컴퓨터 앞에 앉기 싫어서 뭉그적거리는 것은 매한가지다.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매일의 루틴(반복되는 습관이나 행동·절차)으로 삼아야 한다. 매일 운동하는 것이 좋은가? 누워서 영화나 보며 맛있는 것을 매일 먹는 것이 좋은가? 연예인 김종국 같은 사람이야 매일 운동하는 게 좋겠지만, 나는 밤낮으로 먹고 싶은 것 실컷 먹으면서 영화나 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사람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집 안팎을 치우는 등 일하는 것이다.
글도 마찬가지다. 써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지개 한번 펴고 책상에 앉아야 한다.
A씨는 어린 나이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인데 그의 루틴이 새벽 5시에 일어나 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는 벌써 자전적인 에세이를 두 권이나 냈고, 그것을 통해 인생을 정리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스타 강사가 되었다. 스스로 루틴을 만들어 실천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고 가치를 높인 사례다.
송숙희 작가는 《모닝페이지로 자서전 쓰기》(2009, 랜덤하우스)에서 아침 글쓰기에 대해 ‘자기를 돌아보는 습관,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는 습관, 그렇게 하여 언제나 자기 자신과 늘 함께하는 습관 들이기 도구’라고 했다.
아침에 나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은 회고와 성찰을 위한 습관이면서 매일 다양한 주제나 소재를 놓고 삶에 대해 상상하는 신선한 경험이며 내 글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우는 방법이다.
'사실'에 기초…'감정'을 양념처럼…'영향'은 필수
아침에 무작정 책상에 앉아 무엇을 써야 할까 막막하다면 치유 글쓰기 시리즈에서 소개한 글감 찾기 방법을 활용해보자. ‘내 인생의 연대표’에 기록된 사건을 하나씩 꺼내서 쓸 수도 있고, 아무거나 떠오른 사건이나 주제 또는 소재를 놓고 '생각그물'을 그린 후 거기에서 제시된 생각을 따라 글을 써내려갈 수도 있다.
또는 ‘내가 사랑하는 100가지’, ‘감사의 100가지’, ‘하고 싶은 일 100가지’, ‘갖고 싶은 것 100가지’ 등과 같이 100가지 시리즈를 만들어 매일 아침 쓰기에 도전해볼 수 있다. 아무 감정도 잡히지 않고 생각도 정지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누군가에게 보내지 않는 편지를 써보자.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지금은 만나지 않은 옛 친구에게, 그리운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다 보면 옛날로 돌아가 추억이 샘솟으면서 그 시절의 기억이 펼쳐진다.
창고에 처박아놓은 물건을 꺼내는 것도 방법이다. 어릴 적 주고받은 연애편지나 아이들의 옷과 양말 같은 것이 남이 있지 않은 집은 없을 것이다. 옛 물건은 기억의 매개체가 되어 나를 과거로 인도한다.
사진첩을 펼쳐보아도 좋다. 어릴 때 찍은 사진부터 결혼·육아·직장생활 등 다양한 사진을 놓고 사진을 찍던 그 순간의 기억과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 함께 찍은 사람들, 그 시절의 사건과 사고를 자세하게 써보자.
이 모든 방법이 내 인생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글을 쓴 후 거기에서 추려 시대별·주제별·형식별로 분류해 기획함으로써 한 권의 근사한 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단, 글을 쓸 때는 '치유 글쓰기' 세 번째 시리즈에서 강조했듯 사실(Fact)에 기초해 감정(Feel)의 양념을 치고 그것이 만들어낸 파급효과나 영향을 찾아(Find) 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사건으로 인한 감정이나 영향이 빠진 글은 의미 없는 잡동사니를 모아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
끝말잇기 하듯 진실을 정성껏 쓰자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정녕 있다면 책상에 앉아야 한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대체로 단편적이다. 그렇지만 생각을 글로 쓰기 시작하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온다. 단문으로 시작한 질문은 문단이 되고 문단이 하나의 맥락을 관통해나가면 주제가 있는 에세이가 된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오지 않는다면 끝말잇기로 연상하라. 가령 오늘 아침엔 ‘아버지’가 생각났다고 해보자. ‘아버지’ 하면 ‘짜장면’, ‘짜장면’ 하면 ‘엄마 아빠와 함께 먹었다’, ‘먹은 후에 아버지는 나를 업어주었다’, ‘늘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다니던 아버지’, ‘나를 잘 업어주고 예뻐해주던 아버지’, ‘아버지는 언니·오빠에게는 엄했다’ 등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을 끝말잇기 하듯 연상하면서 쓰다 보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담은 에세이가 완성된다.
글이 유려하게 쓰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생각나는 것만 짧게 적는 것을 권한다. 다만 정성껏 쓰자. 나란 사람을 돌아보는 글쓰기인데 대충 쓴다는 것은 나 자신을 홀대하는 일이다. 글을 쓰면서 내 인생을 어루만진다고 생각해야 좋은 글이 나온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한 유려한 글이 좋은 글은 아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좋은 글은 ’사실에 대해, 진실하고 감정이 드러나며, 영향과 효과가 표현되는 글‘이다.
소설가 고 이외수 선생은 《글쓰기의 공중부양》(2005, 해냄)에서 글을 쓸 때 욕심과 가식, 허영을 "경계해야 할 병폐"라고 했다. 그는 "만인이 탄복해 마지 않는 문장을 만들어보겠다는 욕심 … 이러한 욕심들이 응어리진 채로 의식을 메우고 있으면 절대로 경탄할 만한 글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또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된 문장, 끊임없이 열거되는 전문용어, 철학적인 사고나 지적인 이론으로 점철된 문장, 지나치게 남발되는 외국어, 이런 허영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이 돋보이기를 바라지 말라. 허영은 자신의 정신적 빈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가식이나 욕심과 마찬가지로 문장의 생명력과 설득력을 말살시킨다“고도 했다.
요컨대 나의 진실과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자기 생긴 대로 정성껏 쓰는 글이 멋진 글이다.
김효화
- [김효화의 치유 글쓰기] ⑧연상으로 만나는 인생의 어느 순간들
- [김효화의 치유 글쓰기] ⑦매일매일 꾸준히 오랫동안
- [김효화의 치유 글쓰기] ⑥무엇을 쓸 것인가?
- [김효화의 치유 글쓰기] ⑤누구를 위하여 글을 쓰는가?
- [김효화의 치유 글쓰기] ④연대표를 채우며 기억의 타래를 풀자
- [김효화의 치유 글쓰기] ③사실을 바탕으로 감정을 넣고 가치를 발견하라
- [김효화의 치유 글쓰기] ②내 삶의 고통스러운 블랙홀을 열어라
- [김효화의 치유 글쓰기] ⓛ자가치유와 보상의 욕구
- [김효화의 치유 글쓰기] ⑩진실한 글의 첫걸음
- [김효화의 치유 글쓰기] ⑪말하듯이 노래하고, 노래하듯이 쓰자
- [김효화의 치유 글쓰기] ⑫도입은 감각적으로…종결은 간결하게
- [김효화의 치유 글쓰기] ⑬풍성한 문단이 좋은 글을 만든다
- [김효화의 치유 글쓰기] ⑮인생이라는 단편소설집 쓰기

